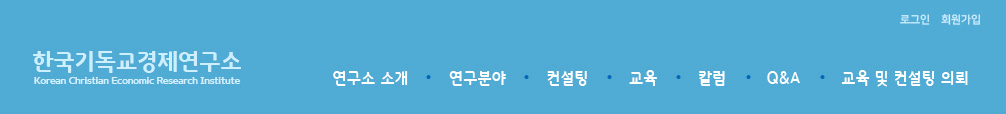교회와 세금(1)
본문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9)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먼저 중시하여야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기독교의 정신을 규명하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여야 할 책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허탄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노동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적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취하여진 개혁이라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교회가 세상의 이익과 불의의 연관을 맺어 일어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위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회의 과제는 이러한 위선에 대한 ‘윤리적 자각’과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교회의 위선은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 내어 교회와 세상을 모두 혼란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세금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스스로 도덕적 위상을 재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개혁의 사안에 직면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교파나 교리’분열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이중 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일면 개혁의 요소도 있었지만, 기층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 경제적 토대위에 종교적 ‘계급주의’를 고착화하며 교회의 권력 지향적 이기주의를 합리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나 경제적 이익에 교회나 성직자는 종속되고 만다.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안을 단지 법의 해석이나 도덕적 잣대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과 같이 우상 신의 모습으로 우뚝 선 거대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직자는 무엇보다도 성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립(reorientation)하여야 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삶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다(막 1:38). 주님은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며(마 10:9),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옳지 않음을 제자들도 각성하고 있었다(행6:2).
성직자의 본연의 자세는 모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적인 일로부터는 자유 할 수밖에 없으며, 부를 소유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성직자들은 부요하신 이로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기억하여야 한다(고후 8:9).
아퀴나스는 십일조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의 임금에도 속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으며, 십일조를 드리기 전에 세금이나 삯을 먼저 공제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십일조와 연관하여 두 가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십일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또 다른 하나는 십일조로 드려지는 헌물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십일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성직자가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며, 이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로 드려지는 헌물은 평신도면 누구든지 참여하여야 할 신앙의 몫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첫 예물을 드리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제사장들은 첫 열매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 직분이 낮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는 구약의 민수기 18장 말씀을 예로 들었다. 주목할 점은 레위인들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부분이다(민18:26). 같은 이유로서 성직자들은 십일조를 교황에게 드려야 하고, 교황은 그 헌금으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아퀴나스는 해석하였다.
위와 같은 아퀴나스의 입장은 후에 중세기 가톨릭의 부패로 그 빛을 잃게 된다. 칼빈(John Calvin)과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얼마의 돈을 내고 영혼의 구원을 살려고 하였던 당시 교황청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질서를 책임질 당시의 체제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라고 보았다. 이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신앙인의 책무였던 것이다.<계속>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